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한 〈이제현 초상〉은 고려 문신 이제현(1288~1367)의 초상은 중국 항주의 저명한 화가 진감여(陳鑑如(14세기 초반 활동)가 그린 것으로 이 초상을 주문한 이는 고려 충선왕(재위 1308~1313)이다. 이 희소한 원대 초상화의 대표작으로 널리 알려진 이 초상은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하고 있으며 국보로 지정되었다.
이제현은 고려 후기 관료이자 문예에 출중한 문인이었다. 그는 원나라 대도(大都)에 머물던 고려 충선왕의 부름으로 그를 옆에서 보필하였고 신실한 불교도였던 왕이 1319년 절강성의 보타사(寶陀寺)에 강향(降香)하러 갔을 때 수종하였다. 이 강향 중에 충선왕은 당시 항주 최고의 화가였던 진감여를 불러 이제현의 초상을 그리고 도록 했고, 역시 항주 출신 문인으로 탁월한 문장가였던 탕병룡(湯炳龍)에게 찬을 쓰도록 했다. 이후 이제현이 그의 초상화를 누군가에게 빌려주었다고 잃어버렸고, 훗날 연경을 다시 방문했을 때 이 그림을 21년만에 우연히 찾게 되어 그 감회를 초상화 위에 적었다.
왜 충선왕은 항주의 화가를 불러 이제현의 초상을 그리게 했는가? 지민경 홍익대 교수는 한국학중앙연구원(원장 직무대행 임치균)이 발간한 《Korea Journal》 2024 여름호에 게재된 논문 <고려 충선왕이 선물한 이제현 초상화에 대한 재조명(Another Look at the Portrait of Yi Je-hyeon, a Gift of King Chungseon)>에서 중국 화가 진감여(陳鑑如)가 제작하고 중국 문인들에 의해 널리 감상됐던 고려의 성리학자 이제현의 초상에 주목했다. <이제현 초상>이 단순한 회화 작품을 넘어 고려의 정치 및 외교를 위한 선물로서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고찰했다. 특히 고려 충선왕이 원 황실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중국 강남 출신의 유력 인사들과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할 때 선물을 어떻게 이용했는지를 분석했다.
지 교수에 따르면 “이제현을 원에 입조시킨 충선왕은 원 황실에서 국가 운영 원리였던 유학에 정통한 전문가이자 정치 조언자로, 자신의 입지를 견고하고 하고자 중국 정통 문인과 유가들의 지지를 얻으려 했다. 충선왕이 고려의 이제현을 총애하고 후원했던 이유 또한, 고려인 중에도 원의 문사와 맞먹는 인재가 있음을 원에 알리고 싶었기 때문이기도 했다. 한편으로는 고려 학자들을 원대 문인계와 연결하여 려-원 관계를 학문적으로 강화하려 했던 시도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문인들의 문화행위를 매개하는 물질로서의 <이제현 초상>은 여타의 문인들의 표상이라 할 수 있는 다양한 미술, 문예 작품들이 비슷한 기능을 가지고 활용되었다는 사실로부터도 그 의미가 확고해진다.”라며 “<이제현 초상>은 단순히 일개인의 초상이 아닌, 충선왕을 둘러싸고 일어난 려-원 관계의 중심에 놓인 사회·문화적 행위의 매개물로 이해할 수 있다. 표면적으로는 충선왕이 신뢰하는 신하에게 주는 선물이지만 초상화가 제작되고 쓰인 과정은 충선왕이 강남 출신의 정통 문인들의 세력을 이용하여 원 황실 내 입지 강화하고자 하는 시도와 연결되어 있다.”라고 했다.

이처럼 한국학중앙연구원(원장 직무대행 임치균)이 발간한 《Korea Journal》 여름호는 “전통 한국 사회에서 외교 선물의 정치학(The Politics of Gift-Giving and Diplomatic Gifts in Traditional Korea)”을 주제로, 선물 외교의 정치·사회·문화적 의미를 탐구한 연구물을 담았다.
이정은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가 쓴 <일본 닛코 도쇼구에 전시된 이국의 선물: 도쿠가와 쇼군을 위한 조선 왕의 선물(Displaying Global Gifts at Nikkō Tōshōgū: The Joseon King’s Gift for the Tokugawa Shogun)>은 조선의 선물이 일본 국내 정치에 어떻게 활용됐는지 잘 보여준다. 신사 도쇼구(東照宮)는 일본 도치기현 닛코에 있는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기리는 묘당으로, 앞마당에는 당시 네덜란드와 조선에서 보낸 이국적 선물이 전시되어 있다. 저자는 이것에 주목해 조선 인조(조선 제16대 왕)가 보낸 동종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복합적인 맥락에서 고찰했다. 조선과 일본 양국이 각자의 필요와 이익을 모색하며 지속적인 논의와 협상을 통해 선물을 정하고 교환하는 과정을 분석해 선물 이면에 담긴 치열한 이해관계를 살펴봤다.
장남원 이화여대 교수는 개항기 전후 외교 선물로 주로 활용된 고려청자의 정치적 의미에 주목했다. <조선 후기와 근대 시기의 외교 선물로서의 고려청자(Goryeo Celadon as a Diplomatic Gift in the Late Joseon and Modern Periods)>는 고려시대에 제작된 청자들이 19세기 개항기 전후 외국인들의 수집 대상일 뿐만 아니라 일본, 프랑스, 미국, 러시아 등 서구 열강과의 관계 속에서 ‘외교 선물’로 이용된 일련의 과정과 의미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살펴봤다. 저자는 이 과정에서 고려와 고려청자를 타자적 관점에서 인식하게 된 우리의 인식 변화와 민족지학적 관점에서 고려청자를 우리나라의 유산으로 인식하게 된 외국의 시각을 비교 분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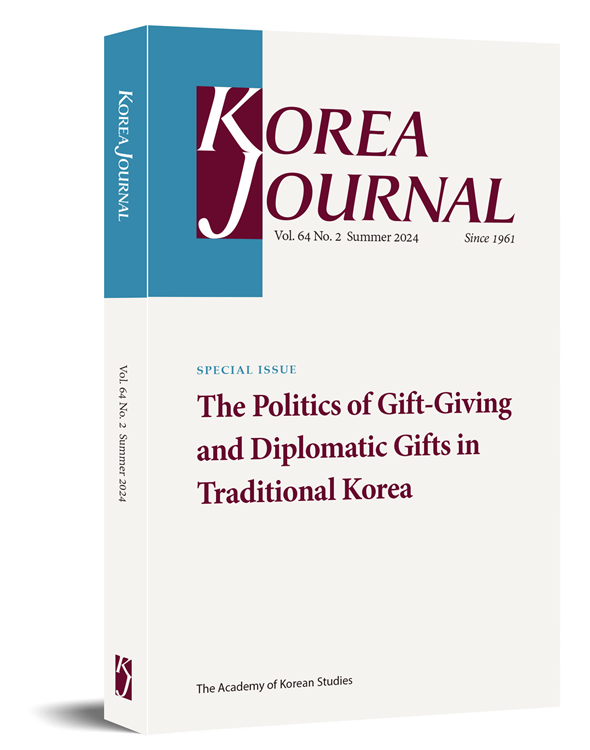
이번 《Korea Journal》 여름호에서 다룬 ‘선물 외교’는 역사, 미술사, 정치 분야 간 학제 연구로서, 14세기부터 20세기 초까지 600년간 우리의 외교관계에서 선물이 활용된 구체적인 사례들을 연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Korea Journal》은 한국학중앙연구원 누리집에서 무료로 읽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