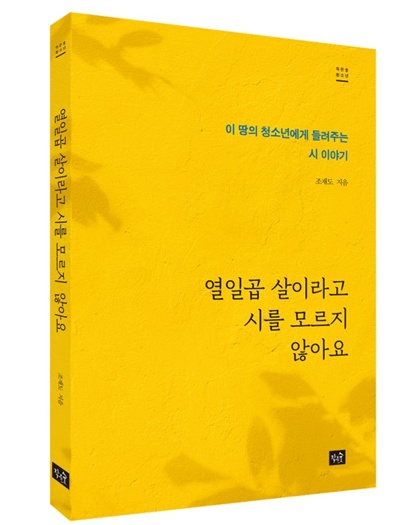
조재도 시인이 펴낸 《열일곱 살이라고 시를 모르지 않아요》(작은숲, 2025)는 입시 공부에 찌든 “이 땅의 청소년에게 들려주는 시 이야기”이다. 이 책의 발간은 한 고등학생의 질문에서 비롯되었다.
5년 전 저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문학 강연을 했다. 강연이 끝나고 질의 시간에 명호라는 학생이 손을 들고 말했다. “중학교 때까지 학교에서 시를 배우기는 했는데 아직도 시가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고등학교에서는 시가 무엇인지 꼭 알면 좋겠습니다.”
조재도 시인은 명호에게 대답을 했다. 그런데 그 대답이 계속 걸렸다. 그 대답이라는 게 참고서에서 나오는 수준을 못 벗어난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이어 “내가 다시 똑같은 질문을 받는다는 나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좋다, 그럼 시와 함께한 내 인생 이야기를 통해 시가 무엇인지를 말해 주자, 생각하게 되었다. 한 편의 시가 사람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시를 알고 감상하고 더 나아가 시를 직접 쓰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인생의 풍요로움을 어떻게 느끼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었다. 시에 대해 아무리 이러쿵 저러쿵 말하는 것보다는 시와 함께 산 인생 이야기를 들려줌으로써 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주자. 이런 생각에서 조재도 시인은 《열일곱 살이라고 시를 모르지 않아요》를 썼다. 명호가 한 질문, “시가 무엇인지”에 답하듯, 편지글 형식으로 써내려갔다.
저자는 이 책에서 국내시 16편, 외국시 10편 모두 26편을 다루었다. 이 책에 소개한 시들은 조재도 시인이 처음 시를 쓰기 시작하던 대학 청년기부터, 1985년 《민중교육》지를 통해 작품 활동을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시를 쓰면서 그리고 인생을 살아오면서 저자의 영혼이 성숙하는 데 커다란 영향을 미친 작품이다. 이 시들을 저자는 읽은 것이 아니라 ‘겪었다’라고 말한다.
“대나무가 자랄 때 마디를 통해 줄기가 자라듯, 이 책에 소개하는 시들은 내 영혼의 성장에 디딤돌 같은 역할을 해주었단다. 내 인생에 들어와 박힌 시. 그러니까 나는 이 시들을 읽은 것이 아니라 ‘겪었다’고 말할 수 있어. 내 인생에 세게 부딪혀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준 시.”
이 시들은 저자의 영혼에 스며들어 살과 피가 되었고다. 어떤 시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 벼락치듯 저자를 일깨워주었고, 또 어언 시는 일상에서 모닥불처럼 은근히 타올라 저자 삶의 구들장을 따뜻이 덥혀주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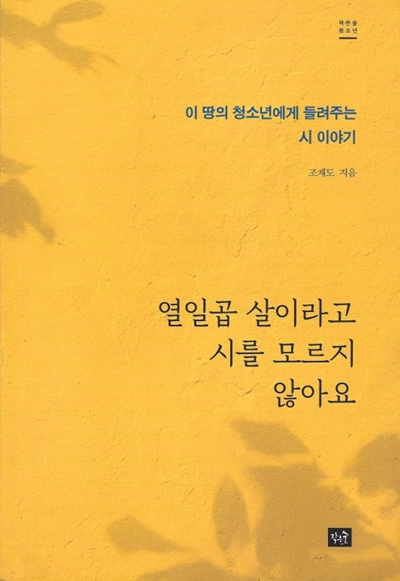
저자는 이 땅의 많은 청소년이 “시가 이렇게 사람의 삶에 녹아들어 그 사람의 인생과 함께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갖기를 바란다.” 참고서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골치 아프고 어렵고 딱딱한 것이 아니구나! 알기 바란다.
조재도 시인은 시 이야기 첫 벗째로 김소월(1902~1934)의 시 ‘박넝쿨 에헤야’를 다룬다. 이 작품은 사후인 1939년 《여성 42호》에 발표되었다. 민요적 향토적 색채가 짙은 이 작품은 그의 시 세계인 한의 세계를 노래한다.
“사람은 자기 자신만이 전부일 때 지옥에서 벗어나지 못해. 인간이나 자연이나 욕망대로 하자면 못할 게 없겠지. 그러나 하룻밤 새 찬서리에 시들어 버린 박넝쿨처럼, 봄이 와 만개한 복숭아꽃이 흔적도 없이 시들어 버린 것처럼,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게 세상의 이치야. 소월은 이러한 인생의 숨을 뜻을 민요적이고 향토적인 이 시에 담아 이야기하고 있다.” 조재도 시인의 설명이다.
조재도 시인은 윤극영 시인의 시 ‘반달’을 초등학교 때 동요로 접했다. 시인은 ‘반달’을 부를 때 특히 1절의 마지막 “가기도 잘도 간다 서쪽 나라로”에 강하게 끌린다고 했다. 이 부분은 맨 첫 소절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의 이미지와 연결되어 험난한 바다를 헤쳐 가는 작은 조각배를 연상시킨다는 것이다. “높고 애절한 선율에 실린 이 가사는 나는 한껏 창공에 밀어 올려 끝없는 영원의 세계를 그리워하게 해.” 저자는 ‘반달’을 통해 존재의 시원과 그로부터 번져 나가는 상상력의 파동을 마음껏 느낄 수 있었다.
저자는 마지막으로 우에다 신고라는 일본의 다섯 아이기 쓴 ‘눈’이라는 3행 시를 소개한다.
옷 위에 멈췄다가
안으로 숨었다가
잠들어 버렸다( 우에다 신고, '눈' 전문)
이 시를 읽고 저자는 전율했다.
“일본의 다섯 살 어린이가 쓴 3행 스무 글자로 된 이 시를 읽고 나는 몸에 전율이 일었어. 머리를 망치로 쾅 얻어맞은 것 같았고 눈물이 나올 것 같았다. 왜 우리나라 아이들에게는 이런 글이 나오지 않을까. 이 시는 아주 짧지만 나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해 주었단다.”
저자는 청소년들과 함께하고 싶어서 이 책 《열일곱 살이라고 시를 모르지 않아요》을 썼지만, 읽다 보면 왜 우리 삶에 소설이, 시가 필요한지 알고 싶은 모든 이에게 필요한 책이라는 생각이 든다. 저자는 말한다.
“우리가 문학을 하고, 그림을 그리고, 음악을 하는 행위 혹은 그것을 감상하는 것은 자신을 정화하고 타인의 영혼을 고양시키기 위해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