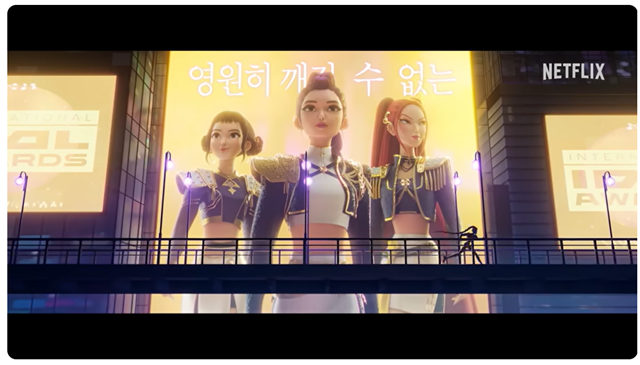
1 ‘케이팝 데몬 헌터스’, 왜 이 이야기가 통하는가 : 해외에서의 인기 의미
(이어서) 3 ‘케이팝 데몬 헌터스’와 오리엔탈리즘(Orientalism)
-- 교수님은 오래전부터 ‘오리엔탈리즘’에 대해 비판해 오셨는데요, 우선 오리엔탈리즘이 무엇인지부터 설명해 주십시오.
에드워드 사이드(Edwald W. Said: 1935-2003) 가 이야기하는 오리엔탈리즘은 ‘서구적 시각에서 바라본 왜곡된 동양관’입니다. 각 나라나 문화권의 음악, 미술, 언어, 건축 등의 ‘문화적 산물’ 혹은 ‘문화적 콘텐츠(Cultural contents)’는 오랜 역사 과정을 통해 형성된 ‘문화적 문법(Cultural grammar)’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한 나라나 문화권의 문화적 콘텐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만든 문화적 문법을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축구에는 축구의 규칙이 있고 농구에도 농구의 규칙이 있습니다. 축구의 규칙을 바탕으로 농구를 보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서구인들이 비서구 문화와 만날 때, 서구인들은 ‘서구인의 시각 = 서구의 문화적 문법’을 통해서 비서구 문화의 문화적 콘텐츠를 바라보았고, 도무지 이해되지 않으니 ‘비합리적, 비과학적, 원시적 문화’라고 낙인찍기 시작한 것이 사이드가 말하는 오리엔탈리즘입니다.
--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실 수 있나요.
다른 예로, 동양의 전통 음악에는 동양 전통 음악을 만들어온 문화적 문법이 있고 이를 ‘음악 이론’이라는 의미의 악론(樂論)이라고 합니다. 서양음악의 악론만 아는 사람은 동양 음악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음악의 보편성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음악엔 국경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음악에는 국경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양음악과 동양 음악은 서로 전혀 다른 악론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악론을 이해하지 못하면 상대방의 음악을 즐길 수 없습니다. 그저 자신이 이미 지니고 있는 악론을 바탕으로 듣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음악에는 국경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국경은 굳게 닫혀있는 국경이 아닙니다.
‘음악은 아는 만큼 들린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는 음악의 특수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각 문화권의 음악에는 그들만의 악론이 있고, 상대방의 악론을 공부하고 이해하면 국경 넘어 다른 세계의 음악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구인들은 오래전부터 음악을 정의하면서 ‘음악의 3대 요소’로 선율(=멜로디), 리듬, 화성(=하모니)을 제시했고 아직도 대부분의 교과서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요소 중 어느 것 하나라도 없으면 음악이 아니라는 것이고, 굳이 표현하자면 ‘원시적인 음악’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독일의 유명한 사회학자 막스 베버(Max Weber: 1864-1920)는 그의 『음악 사회학(Die rationalen und soziologischen Grundlage der Musik)』(1921. *1993년에 한국어로 번역)에서 ‘7음계의 화성을 지닌 서양음악이 가장 발달한 합리적인 음악’이라고 단언하기도 합니다.
동양 전통 음악은 음악의 3대 요소라는 화성이 없는 선율음악입니다. 실제로 전 세계 음악 가운데는 선율음악이 훨씬 더 많습니다. 서구인의 시각으로 보면 음악도 아니고 굳이 부른다면 합리화가 덜 된 원시음악이라는 것이지요. 이런 것이 전형적인 오리엔탈리즘입니다. 서구의 문화적 문법을 바탕으로 전혀 다른 문화적 문법으로 만들어진 다른 문화권의 문화적 콘텐츠를 ‘원시적, 비합리적, 비과학적, 전근대적’이라고 낙인찍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축구를 즐기는 사람이 농구도 즐기려면 농구의 규칙을 알아야 합니다. 축구의 규칙으로 농구를 바라보면서 ‘1초에 5번씩 핸들링을 하는데 심판은 호루라기도 불지 않는다’라고 욕하면서, ‘농구는 이해할 수 없는 미개한 경기’라고 단정하는 이상한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이런 사람의 태도가, 서구의 문화적 문법을 바탕으로 비서구의 문화적 콘텐츠를 이해할 수 없는 미개한 문화라고 낙인찍는 오리엔탈리스트와 같습니다.
농구도 즐기고 싶으면 농구의 규칙을 알아야 하듯, 동양 음악을 즐기고 싶으면 동양 음악의 악론을 알아야 합니다.
-- 이 애니메이션은 흥미롭게도 ‘한국계 미국인’ 창작자들이 중심에 있습니다. 한국인이 아닌 이들이 한국 문화를 다루는 이 현상, 교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이런 현상은 한국 문화가 세계적 관심을 끌고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한국계 미국인’의 입장에서는 한국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알고 있고 영어도 능숙하기에 한국 문화를 토대로 한 문화 상품을 제작하여 전 세계를 대상으로 영어로 보급하면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저는 ‘한국계 미국인’을 포함해서 ‘한국계 외국인’들이 한국 문화를 바탕으로 문화 상품을 만들 자격과 역량이 있고, 또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서 윈-윈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한국계 외국인’들과 한국인은 한국 문화를 접하고 이해하는 깊이에서는 많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귀신이나 악귀 관념으로 좁혀서 이야기를 해보지요. 한국인들은 민속학 전공자가 아니더라고 어릴 때부터 듣고 읽고 보아온 수많은 동화, 전설, 영화, 드라마, 소설 등을 통해서 해원상생이라는 관념을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정도의 차이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한국계 미국인’들과는 한국 문화를 이해의 깊이가 다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그들이 한국 문화를 바탕으로 한 문화 상품을 만들 때는, 제작 과정에서 관련 부분의 ‘한국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야 의도하지 않은 실수나 왜곡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 <케이팝 데몬 헌터스>는 서구 중심의 시선 없이 한국 문화를 풀어냈다고 보시는지요?
<케이팝 데몬 헌터스>는 피상적으로는 ‘케이 콘텐츠’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서구적 악마론을 바탕으로 한국 전통의 악귀론을 대체해 놓았습니다. 영화를 만든 사람들이, 한국의 귀신-악귀는 절대악이 아니라 언제나 해원상생의 대상이라는 우리의 전통적인 귀신-악귀 관념이나 해원상생의 관념을 알고 있었다면, 메인 스토리를 그렇게 설정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 <케이팝 데몬 헌터스>는 서구적인 악마론에 한국의 전통문화 요소를 억지로 끼워 넣은 한국적이지 않은 작품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제작에 참가한 사람들은 한국의 귀신-악귀 관념이나 해원상생의 관념이 서구의 것과 다르다는 점을 이해하지 못했고, 자신들이 아는 서구 악마론의 틀에 한국의 전통적인 특정 요소들을 짜깁기해서 넣은 것이지요. 의도하지 않았겠지만 이 역시 큰 틀에서 보면 오리엔탈리즘의 논리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 보도에 의하면 인기에 힘입어서 후속편을 제작할 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저도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후속편이 기존의 논리를 바탕으로 제작된다면 아마도, (1) 어찌어찌해서 악령의 왕 귀마가 더 강력한 힘을 지닌 존재로 부활하고, (2) 더 강력해진 헌트릭스가 더 강력해진 새로운 노래로 귀마를 물리치는 퇴마 영웅담일 것입니다. 아마 이런 식이라면 후속편이 성공하기 힘들 겁니다. 참 식상하고 예측 가능한 후속편이지요. 일반적으로 인기 영화가 후속편에 실패하는 것도 대부분 이런 뻔하고 예측 가능한 설정 때문입니다.
저는 나름대로 이런 후속편을 상상해 봅니다. 예를 들어, (1) 귀마가 더 강력한 힘을 지닌 존재로 부활하고, (2) 더 강력해진 헌트릭스가 더 강력해진 새로운 노래로 귀마와 대결하지만, (3) 어떤 계기론가 헌트릭스가 진우를 통해서 귀마가 억울하게 죽임을 당해서 악령의 왕이 된 과거를 알게 되고, (4) 귀마의 원한이 어떻게 맺히게 되었는 지를 조사하고 알게 되어, (5) 헌트릭스가 귀마의 원한을 해원해 주고, (6) 귀마는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헌트릭스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면서 스스로 저승으로 떠나는 후속편!
-- 그런 후속편이 나온다면 기대하는 것이 있으신가요?
이런 후속편을 보는 서구인들은 너무나 낯선 악마의 모습에 ‘이게 한국 전통문화인가?’ 하는 호기심이 생길 것입니다. 그 호기심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 전통문화에 대해 스스로 알아보고 공부하는 이들도 생기겠지요. 아마, 나름대로 찾아서 공부한 사람들은 SNS를 통해 경쟁적으로 한국 전통문화의 귀신, 악귀, 해원상생, 까치 호랑이, 저승사자, 무당 등등을 소개하는 글을 올리지 않겠습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외국인들은 한국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하게 되겠지요. 후속편이 이렇게 성공하면, 3편을 만들지 누가 알겠습니까?
서구중심적 오리엔탈리즘에서 벗어나 비서구 사회의 문화를 이해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관심과 애정만 가지고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 문화의 ‘문화적 문법’을 배우고 알아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구인들이 국악을 즐기려면 국악의 악론을 어느 정도라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서구 음악의 기준으로 들을 뿐입니다. 그래서 음악은 아는 만큼 들리고, 미술은 아는 만큼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화상대주의라는 말을 알고 있지만, 그것을 실천하는 것은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