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00년대 초 기울어져 가는 나라의 운명을 지켜보며 많은 한인이 한반도를 떠나기 시작했고, 그중 일부는 러시아를 새로운 목적지로 삼았다. 고국을 떠난 이들은 새로운 땅에서 어떻게 적응했을까? 말도 통하지 않은 이국땅에서 적응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 러시아로 간 한인들의 삶을 다룬 책이 나왔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가 최근 펴낸 신간 《귀화를 넘어서: 러시아로 간 한인 이야기》(송영화 지음)가 그것이다. 이 책은 20세기 초 러일전쟁 후 한인이 식민지가 되어가는 고국을 떠나 어떻게 러시아 현지에서 적응하고, 다시 고국과 관계를 맺으려 했는지 ‘귀화’라는 소재를 통해 추적한다.
이 책은 1905년 이후 러시아로 이주한 한인들이 고국의 식민화와 현지 적응이라는 이중 과제 속에서 어떻게 생존하고 대응했는지를 조명했다. 당시 러시아 이주 한인들이 정치적 격변 속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 분석하고, 특히 귀화가 단순한 법적 신분 변경이 아니라 적극적인 생존 전략이었음을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저자는 한인들이 차별과 도전에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해 갔음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설명했다. 귀화를 통해 러시아 사회에서 법적, 경제적 지위를 확보하는 한편, 고국과의 관계를 유지하며 독립운동에도 영향을 미친 내용을 수록했다.
“1910년 9월 1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한인 성인 남성 9,980명의 대표 16명은 러시아 귀화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러시아 극동의 주요 도시 블라디보스토크, 우수리스크, 하바롭스크와 주요 농촌지대인 연추와 소성 등지에 거주하는 한인의 목소리를 대신했다. 1910년 8월 29일 한일병합조약이 발효된 지 사흘만의 일이었다.”
1910년 11월 블라디보스토크 한인거류민회는 러시아 국적 취득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의했다. 여기에는 항일망명자도 함께했는데, 안정된 한인사회를 만들고 그러한 기반 위에 장기적인 항일운동이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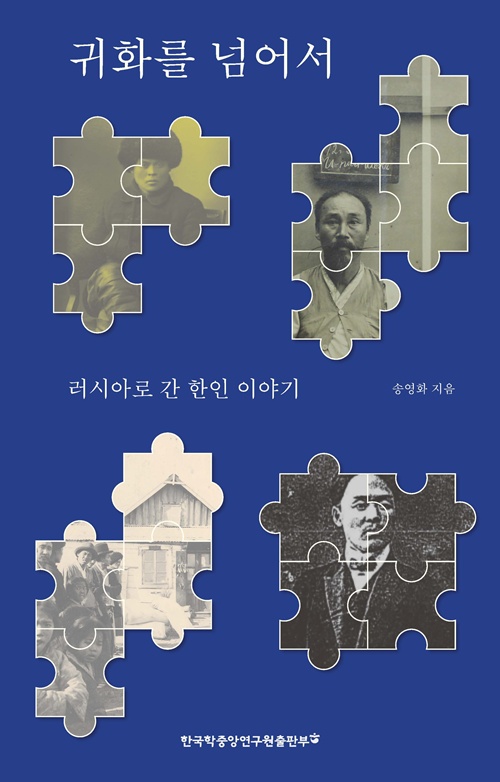
1905년부터 1917년까지는 한반도의 식민지화 과정에서 새롭게 귀화한 한인, 즉 신귀화자가 러시아 한인사회에서 새로운 사회계층으로 자리 잡던 시기였다. 이 책은 ‘신귀화자’라는 프리즘을 통해 한인이 해외로 이주해 정착하고, 귀화를 통해 일상생활을 영위하며 현지에서 정치적 주체로 서기까지의 과정을 묘사했다.
저자는 신귀화자라는 역사적 집단을 조명하고, 이들이 구귀화자 및 비귀화자와 맺은 관계를 밝혀, 동적이 다층적인 러시아 한인사회의 모습을 복원하였다. 그래서 대립, 공생과 협력하며 생존을 도모한 한인사회의 모습을 생생하게 볼 수 있다.
“러일전쟁 후 귀화자와 비귀화자는 단순히 대립만 한 것이 아니라 공생하고 협력했다. 이들은 공문서의 매매, 대여, 위조 등 러시아 행정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해 생존을 도모했다. 블라디보스토크의 신한촌은 귀화 여부를 떠나 현지정치와 고국정치가 활발히 전개된 대표적 공간이었다. 이곳에서는 귀화 여부보다 망명자와 정주유력자의 상호작용이 중요한 요소로 작동하며 정치활동이 이루어졌다. 이들이 모여 대립하고 이를 극복해 다시 협력하는 과정은 민족이라는 범주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저자는 “신귀화자는 거주국에서 이주민의 생활 조건을 개선하는 현지정치와 한국의 식민지화에 저항 담론을 만드는 고국정치, 양쪽 모두에 관심을 가진 존재”였다고 결론지었다.
저자는 한국, 러시아, 일본 등에 보관 중인 다양한 사료를 활용했으며, 전체 분량의 20퍼센트가 미주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될 만큼 방대한 자료 조사를 바탕으로 했다. 일본외무성 기록, 러시아 국립문서보관소 문서 등 당대 기록된 1차 자료를 기반으로,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생존을 모색해야 했던 러시아 귀화 한인들의 삶을 생생하게 전달했다.
특히 기존 연구가 한인의 독립운동과 민족주의적 관점에 집중했다면, 이 책은 한인들의 삶을 폭넓은 배경에서 조명했다. 아울러 국적이 시대와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유동적인 개념임을 강조하며, 한인들이 단순한 피지배자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선택하고 대응했음을 보여줬다. 이를 통해 국적을 단순한 법적 개념이 아니라 시대적 배경 속에서 변화하는 동적인 개념으로 재해석했다.
이를 통해 국가 경계를 넘나들며 살아간 이들의 경험을 조명하는 동시에, 오늘날의 이주와 국적 문제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했다. 한반도를 떠나 러시아에서 새로운 삶을 개척한 한인들―그들의 선택은 어떤 의미를 가지며,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남기는지 《귀화를 넘어서: 러시아로 간 한인 이야기》는 그 깊은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한다.
“한인이 귀화를 통해 거주국과 새로운 관계를 맺고, 다시 고국의 정치문제에 관여하는 행위는 국민과 민족이라는 두 범주가 공존하는 가운데 이주민의 정체성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여준다. 국민과 민족이 반드시 일치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양립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보면, 러일전쟁 후 한인의 러시아 귀화는 해외 한인이 겪은 20세기 초 한반도 식민화 경험의 일부이자, 고국과 현지를 넘나드는 동아시아 초국적 역사 현상의 하나인 것이다.”